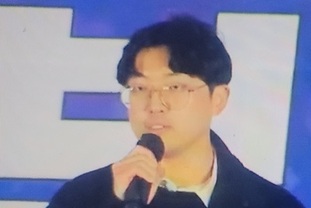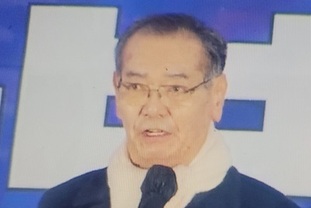▶ 열린 정치, 따뜻한 정치
송태조 조광윤은 황위에 오른 후 권좌를 단정히 하고 대전(大殿)의 모든 문들을 다 활짝 열어놓게 했다.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이요. 바르지 못한 것들을 억제하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줘야 하오.」
조광윤은 이와 같이 광명정대하고 거리낌 없이 나라를 다스려나갔다. 이러한 조광윤은 바로 공자(孔子)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군주의 상(像)이었다. 요즈음의 민주주의 제도 아래에서도 한 나라의 통치자가 맑고 투명한 정치를 위해 진정한 의미의 ‘열린 정치’를 한다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송태조 조광윤은 신하를 대함에 있어서 비록 스스로 ‘고왕(孤王)’, ‘과인(寡人)’, ‘불곡(不谷)’ 등의 겉치레로 겸양하는 말을 쓰지는 않았으며, 자신을 지고지상의 황제로 간주하지도 않았다. 조광윤은 “홀로 우뚝 솟은 바위처럼 고독할지언정, 옥처럼 희소한 것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는 황궁에서 집무할 때에 대전(大殿)의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신하와 백성들에게 열린 마음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추앙을 받았다.
조광윤은 신하와 백성들을 제압하려 하지 않았으나, 결코 졸렬하고 나약한 황제가 되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백성과 신하들을 사랑했고 신하들을 위엄 있게 대하면서도 그들을 사랑했다. 사리에 밝은 역대 제왕들과 마찬가지로 조광윤의 얼굴은 늘 온화하고 웃음 띠며 화내는 일 없이 차근차근 잘 타이르고 인도했다.
2. 민위방본(民爲邦本): 백성은 나라의 기틀
역대 많은 왕조의 어리석은 군주들은 민심을 얻든 말든 상관없이 계속 제왕노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봉건전제군주로서 조광윤은 정권을 잡은 동시에 많은 면에서 민심을 얻게 되었다. 그는 조령(詔令)에서 “군대 또는 국가는 백성의 다음으로 고려하는 대상”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상징적, 선언적 의미’가 있지만 다른 많은 제왕들보다 인식이 앞섰다고 볼 수 있다.
일찍이 ‘민본사상’을 주장한 대표적 학자는 맹자(孟子)이다. 그는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이요, 토지는 그 다음이며, 군왕은 가장 중하지 않다. 민심을 얻어야만 나라를 얻을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책읽기를 좋아했던 조광윤은 아마도 맹자의 사상에 많은 감화를 받은 듯하다.
또한 조광윤은 ‘정관의 치(貞觀之治)’로 널리 회자되고 있는 당태종 이세민(李世民)의 ‘이인위본(以人爲本)’ 사상도 거울로 삼았다. 당태종은 이세민은 말했다.
「백성은 물이요, 황제는 배다. 물은 배를 띄우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水能載舟 也能覆舟). 그러니 배를 무사히 저어가고 싶다면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항상 물을 신경 써야 한다.」
송태조 조광윤은 하루아침에 천하를 얻어 황제의 높은 자리에 등극했지만 위 보다 아래 백성들의 사정과 형편에 대해 더 많은 심혈을 기울였기 때문에 천하에 명망이 자자했다.
조광윤은 “우리가 후주를 이어 받았지만 정치는 새롭게 해야 한다.”고 마음먹고, 황제가 된 이상 여러 할거정권을 통일시키기 위한 전쟁을 전개하는 한편, 최우선적으로 자신의 통치지역에서 ‘유신(維新)’ 즉 정치개혁을 실시하기로 했다.
옛 왕조가 흥망성쇠했던 경험과 교훈을 주의 깊게 받아들인 그는 우선 먼저 부과세(賦課稅)를 경감하고 농업을 장려하며 백성의 부담을 줄이고 생활을 안정시켜 원기를 회복하게 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해 나라의 경제를 안정시키고 국가의 재력을 부강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