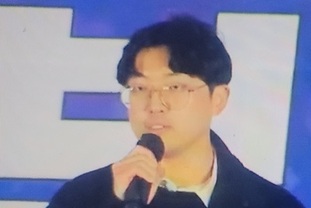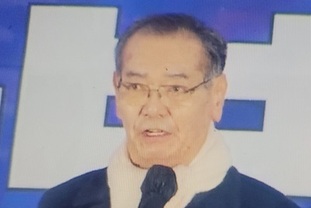당나라 때부터 양세법(兩稅法)을 실시한 이래 나라는 일부 필수품을 조달하기 위해 백성들이 조정에 필요한 물품을 양세로 환산해 납부하는 것을 허용했다. 오대(五代)의 각 나라에서는 이 방법을 시행했고, 송나라 초기에도 이 방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납부하는 필수품의 수량을 채우기 위해 관청에서는 흔히 백성들에게 강압적으로 물품을 할당해 바치게 했다.
이 문제점을 발견한 조광윤은 970년(태조11) 4월에 각 지방에서 마음대로 필수품을 환산해 할당하지 못하게 하는 금지령을 반포했다.
「각 지방에서 양세(兩稅)로 환산하는 필수품은 현지의 생산물이 아닌 경우에는 할당하지 말아야 한다. 무릇 견사, 견직물, 삼베, 향료, 깃털, 화살대, 피혁, 젓가락, 뿔 등은 산지(産地)에서 2년간 사용할 것을 조달하며, 과다한 부담을 안겨 백성을 힘들게 하지 말아야 한다.」
‘필수품을 환산해 할당하는 것’이란 나라에서 조달하려는 필수품이 현지에 없을 경우, 현지에서 생산되는 물품으로 환산하여 대체하는 것이다. 지방관리들은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 백성에게 해를 끼치고 세금부담을 가중시키는 비리를 저질렀던 것이다. 이 문제들을 감안해 조광윤은 특별히 “현지의 생산물이 아니면 과표(課標)를 할당하지 말아야 하며, 현지의 생산물로 환산해 대체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고 금지시켰던 것이다.
후촉시기에 충주(忠州)에는 고기 잡는 관습이 있었다. 후촉정권은 일반 과세 외에 어세(漁稅)를 더 부과하여 충주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했다. 이 폐단을 알게 된 조광윤은 후촉을 평정하자 곧 조령을 내려 어세를 폐지하게 했다. 또 후촉시기에 재주(梓州) 일대에는 전문적으로 새매를 기르는 응요호(鷹鷂戶)와 사냥꾼이 있었는데, 주의 관리는 응요호에게 매년 꿩과 토끼를 공급하고 사냥꾼은 해마다 피혁을 상납할 것을 요구했다. 또 광주(光州)의 응요호에게 해마다 애완조(愛玩鳥)로 새매를 공급하도록 강요했다. 이에 대해 조광윤은 966년(태조7) 4월에 명령을 내려 이를 모두 폐지하도록 했다. 조광윤은 실로 백성을 사랑하고 은혜를 널리 베풀었다.
남한을 평정한 후 반미(潘美)가 조광윤에게 보고했다.
「남한에는 진주(眞珠) 채취를 업으로 하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남한왕 유창(劉鋹)이 조직한 미천도(媚川都)가 바로 진주 채취대(採取隊)입니다. 심해에서 진주를 채취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어서 바다 속에서 생명을 잃는 자가 많다고 합니다.」
조광윤은 즉시 명령을 내려 백성이 진주 채취를 업으로 하는 것을 폐지시키고 ‘미천도’를 해산시켰다.
또 그는 각 주에서 납부한 세금상황을 살펴보다가 계양감(桂陽監)이 해마다 납부하는 백금의 수량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다. 그는 재상 조보에게 말했다.
「계양(桂陽)에서 상납하는 백금이 너무 많은 것 같소.」
재상 조보가 아뢰었다.
「그곳 특성에 의한 것입니다. 계양에는 백금이 많이 나기 때문이지요.」
조광윤이 지시했다.
「산(山)의 이점은 많으나 채취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오. 백성에게 과중한 부담을 안기지 마시오.」
그는 계양에서 상납하는 백금의 3분의 1을 감면하라고 명하고 민력을 아낄 것을 주문했다.
송나라 건국 후 날씨가 좋아 몇 년 동안 풍년이 들자 조신들은 잇달아 황제에게 축하의 인사를 올렸다. 그러나 조광윤은 이렇게 말했다.
「농가는 풍년이 들면 오히려 곡물의 세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고 들었소. 그들의 주인이 돼서 어떻게 모르는 척 하겠소. 조정에서는 응당 조절해줘야 할 것이오.」
농가에서 곡식을 많이 생산해도 불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관청에서 세금을 올리지 않으면 곡물가격을 내리기 때문이었다. 그는 특별히 관청에서 고가로 수매하여 농민들의 이익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하라고 명했다.
송나라 초기에 조정에서 파견한 조세감독관들은 대부분 청렴결백한 관리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조정의 수입을 올리고 국력을 증강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백성들의 조세를 과다하게 징수하는데 열을 올렸다. 심지어 어떤 관리는 조세를 많이 거둬들였다는 이유로 조정에서 표창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송태조 조광윤은 이것을 수치스럽고 악랄한 행위로 간주하고 친히 따져 물어 과다한 조세를 부과하는 악습을 엄중히 금지했다.
966년(태조7) 4월, 광화군(光化軍)의 장수 장전조(張全操)는 조광윤에게 상소(上疏)를 올려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인 곡창의 관리에게 상(賞)을 내려 줄 것을 간했다. 이에 대해 조광윤은 특별히 다음과 같은 조령을 내렸다.
「물자의 출납에 인색한 자라면 관리들을 꼽을 수 있다. 선여(羨余)를 남기려면 가렴주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장전조는 “곡창 관리들이 곡물 1만석, 목초 5만 다발 이상의 선여를 상납한 자에 대해서는 3사(三司)에서 상(賞)을 내려 주기를 요구한다.”고 상소했다. 백성에게 조세를 과다부과하지 않거나 군량을 사사로이 감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선여를 남길 수 있겠는가? 이러한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관청에서 정한 수량 외에 기타 조세의 납부는 엄중히 금지해야 한다.」
장전조의 소행은 그가 황제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자각적(自覺的) 민본주의자(民本主義者)인 조광윤이 나라에 납세할 때 선여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나라가 부유하려고 백성을 가난하게 해서는 안 된다. <不以國富而使民窮>”는 ‘애민사상(愛民思想)’의 구현이었다. 조광윤은 “세상을 다스리려면 백성을 사랑해야 하고, 양생(養生)하려면 욕심이 적어야 한다.”는 말을 아주 좋아했다. “治世莫若愛民, 養身莫若寡欲”이라는 글을 병풍과 족자에 써서 대전(大殿)에 걸어놓고 그는 수시로 자신을 일깨우고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