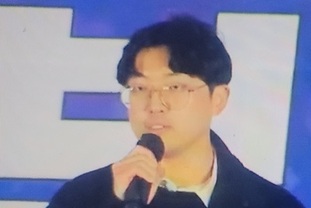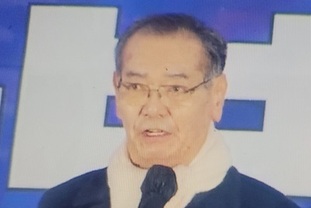954년 1월 1일, 시영(柴榮)이 후주의 황위에 올랐는데, 당시 북한왕(北漢王) 유숭(劉崇)은 곽위가 자기 형 유지원(劉知遠)이 세운 후한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앙심을 품고 있었다. 원수 갚을 기회를 노리고 있던 유숭은 곽위가 죽고 세종이 즉위해 국상(國喪)으로 나라가 어수선해지자 후주를 멸망시킬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거란과 연합해 대거 침공했다. 이때 거란은 양곤(楊袞)을 파견해 1만여 기마부대를 이끌고 북한(北漢: 951~979)을 돕도록 하고, 유숭은 3만 병사를 출동시켜 장원휘(張元徽)를 선봉장으로 삼아 남하했다. 이 소식이 변경(汴京)에 전해지자 후주 조정은 온통 혼란 속에 빠지게 된다. 세종은 급히 대신들을 소집해 대책을 강구하고 친히 군사를 이끌고 출정하기로 한다. 그러자 풍도(馮道)를 비롯한 조정대신들이 극구 반대했다. 즉위한지 얼마 되지 않고 국상까지 치러서 나라가 안정되지 않아 민심이 흔들리기 쉬운 상황에서 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34세의 혈기방장한 세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제로서 받은 치욕은 잊지 말아야 하며 반드시 찾아온 적은 물리쳐야 한다.”고 결심을 굳힌 세종은 유숭의 침공을 강력 응징하기로 했다. 954년 3월 11일, 세종은 유숭의 명분 없는 침공을 징벌하기 위해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변경에서 출발했다. 밤낮으로 행군하여 18일 만에 택주성 동북 15리 밖에 있는 마을에 당도해 군사를 주둔시켰다.
북한왕 유숭은 군사를 친히 거느리고 진군해 먼저 형주(邢州)에서 후주의 소의(昭義)절도사 이균(李筠)의 군사를 무찔렀다. 참패한 이균은 노주(潞州) 영성(嬰城)으로 도망쳐 성을 지키기로 했다. 그러나 유숭은 시간을 벌기 위해 노주를 치지 않고 곧장 남하하여 고평(高平)으로 진군했다. 고평에 당도한 후주군 선봉부대가 성의 남쪽에서 북한군 선봉부대와 맞닥뜨려 교전했는데 후주군이 승리를 거두었다. 초기 접전에서 승리한 세종은 크게 고무되어 통솔하고 있던 1만여 명의 군사를 3개 부대로 나누었다. 시위마보군도우후 이중진(李重進)과 활주(滑州)절도사 백중찬(白重贊)이 서쪽 진영을 맡아 좌군(左軍)이 되고, 시위군도지휘사 번애능(樊愛能)과 보군도지휘사 하휘(河徽)는 동쪽 진영을 맡아 우군(右軍)이 되고, 선휘사(宣徽使) 향훈(向訓)과 정주(鄭州)방어사 사언초(史彦超)는 정예기마병을 이끌고 중도진영을 맡았다. 세종은 중도진영에 가담했다. 전전(殿前)도지휘사 장영덕(張永德)이 황제의 호위대장 임무를 맡았는데, 이 때 28세의 금군장령(禁軍將領) 조광윤은 장영덕의 부하였다. 후주군과 북한군은 즉시 접전을 벌였다. 하양(河陽)절도사 유사(劉詞)가 이끄는 후위대군이 아직 당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후주군은 1만여 명의 병력으로 4~5만 명의 북한과 거란의 연합군을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후주군 병사들이 겁을 먹기 시작했다. 한편 후주군의 병력이 얼마 되지 않은 것을 알게 된 북한왕 유숭은 거란군을 끌고 온 것을 후회했다. 자신의 수만 명의 병력이면 1만여 명의 후주군을 거뜬히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았다. 승리의 확신을 가진 유숭은 전공을 거란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거란병의 출전을 가로막았다. 유숭이 예측했던 대로 쌍방이 접전한지 얼마 안되어 후주군 진영은 큰 혼란에 빠졌다. 북한 좌군의 장원휘는 용맹하게 선두에 서서 후주의 우군을 공격했다. 후주 우군대장 번애능과 하휘는 온산을 뒤덮은 북한군이 파죽지세로 공격해오자 졸지에 사기를 잃고 말았다. 후주의 동쪽 우군은 대패했고 미처 달아나지 못한 수천 명은 북한군에 항복했다. 번애능과 하휘는 부대를 팽개치고 수천 여 기마군을 끌고 어디론지 도주했다. 후주의 우군이 북한군에게 격파되자 자칫 후주군이 전멸당할 절대절명의 위기에 직면한 세종은 근위대를 이끌고 날아오는 화살을 무릅쓰고 독전했다.
바로 이때 금군장령 조광윤이 나서며 큰소리로 외쳤다.
「군주가 위험에 처했는데 우리가 어찌 목숨 걸고 싸우지 않으리오!」 이는 조광윤이 우리에게 처음 보여준 전장에서의 용맹한 모습이다. 위급한 상황에서 결단을 내린 조광윤은 상관인 장영덕에게 건의했다. 군사를 두 부대로 나누어 우익은 그가 맡고 좌익을 맡은 장영덕은 고지를 점령하고 화살의 먼 거리 살상우세를 발휘해 양군이 협공하는 태세를 취하자고 했다. 어쩔줄 몰라하던 장영덕은 즉시 그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각자 2천 명씩 군사를 이끌고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필사의 출격을 했다. 조광윤은 앞장서서 쏜살같이 말을 달려 적진을 향해 돌진하며 절륜한 무공으로 적병을 추풍낙엽처럼 휩쓸었다. 지휘관의 용맹한 모습에 힘을 얻은 병사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일당백(一當百)의 사투를 벌였다. 목숨을 걸고 싸우는 후주군의 기세에 눌려 북한군의 진영은 하나 둘씩 무너지기 시작했다. 북한의 선봉장 장원휘가 말에서 떨어지자 후주군 병사들이 달려들어 난도질을 했다. 선봉장이 죽자 북한군의 사기는 급기야 땅에 떨어지고 전군은 패배하고 말았다. 이를 바라보고 있던 거란의 지원군도 구원의 손길을 뻗치지 못하고 달아났다. 이리하여 전쟁의 상황은 급변했다. 북한군은 점점 무너지고 후주군은 싸울수록 더욱 용감해져 북한군의 시체가 산야를 뒤덮을 때까지 칼날을 멈추지 않았다. 조광윤은 또 북한 추밀부사(樞密副使) 왕연사(王延嗣)를 단칼에 베어 죽였다. 바로 이때 지원군 유사가 당도하게 되어 후주는 이번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
고평전투에서 조광윤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결전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는 위급한 상황을 맞아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병사들을 격려하며 용감하게 나서는 기개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4~5배가 넘는 강적을 거뜬하게 물리쳤으며 탁월한 군사재능도 과시했다. 병법에 “사지에 빠진 후에 생존을 구한다.”는 말이 있다. 어릴 적부터 사숙(私塾)에서 공부하고, 무장으로서의 큰 뜻을 가지고 있던 조광윤은 이 병법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고평전투 이후 장영덕은 조광윤의 군사적 재능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세종도 특출하게 잘 싸운 그를 총애하게 되었다. 조광윤은 불과 28세의 나이로 일약 고위장군인 전전도우후(殿前都虞侯) 겸 엄주(嚴州)자사로 승진했다. 조광윤은 이 고평전투를 통해 비로소 군부엘리트로 발돋움하게 되었고, 황업(皇業)의 기반을 닦는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뎠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