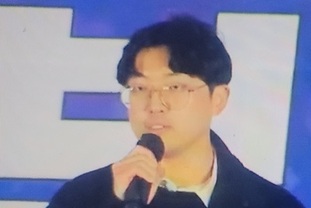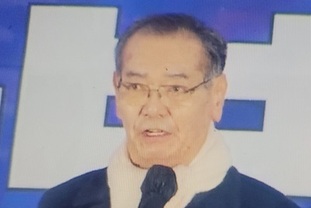사실 중국 무술은 한자 ‘武術’의 중국발음 ‘우슈(wushu)’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일반에서는 이를 ‘쿵후’라고 즐겨 쓰는데 이는 한자 ‘功夫’의 중국식 발음이다. ‘우슈’는 근래 중국정부가 체력증진과 국위선양을 위한 스포츠종목으로 변화시켜 올림픽종목에 넣기 위해 태조장권을 포함한 여러 장권(掌拳)을 하나로 통일시킨 것이다. 우슈종목 중에서 대표적인 장권(長拳), 남권(南拳), 태극권(太極拳)은 중국 권술(拳術)의 대명사가 되었다.
▶ 태조장권(太祖長拳)의 의미 깊은 무공초식(武功招式)
재미있는 사실은 조광윤이 창안해낸 태조장권의 무공초식 중에 ‘형진참장(衡陳斬將)’과 ‘하삭입위(河朔立威)’라는 것이 있다. ‘무공초식’이라 함은 무술, 무예 등을 익히는 데 필요한 기본동작을 말한다. ‘형진참장’의 유래를 살펴보자. 963년(태조4) 조광윤이 황제가 된지 막 3년이 지났을 무렵, 호남왕(湖南王) 주보권(周保權)이 송태조에게 형주자사(衡州刺史) 장문표(張文表)가 반란을 일으켰으니 원병을 보내 반란을 평정해 달라고 간청했다. 이때 송태조는 장문표반란 진압을 기회로 형남(荊南)과 호남(湖南)의 두 정권을 일거에 평정해 버렸다. ‘형진참장’에서 ‘형진(衡陳)’이란 ‘형주(衡州)’자사 장문표를 치기 위해 송군이 펼친 군대의 배치를 의미하고, ‘참장(斬將)’이란 “적군의 장수를 벤다.”는 뜻이다. 따라서 ‘형진참장’ 초식은 송군이 반란군 형주자사 장문표를 진압하고 나아가 용맹한 기세로 형남과 호남 두 지역까지도 휩쓸어 제압한다는 위세(威勢)를 뜻한다. 그리고 ‘하삭입위’는 조광윤이 황제가 된지 불과 몇 달이 되지 않아 소의절도사 이균(李筠)이 노주(潞州)에서 반기를 들었을 때, 그가 친히 군대를 이끌고 진압에 나서 ‘하삭(河朔)’을 거쳐 택주성을 공격해 함락함으로써, 등극 초기에 위세를 떨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하삭입위’에서 ‘하삭(河朔)’이란 이균이 반기를 든 택주 부근의 군사요충지를 말하고, ‘입위(立威)’라는 것은 그 반란을 제압함으로써 새로 황위에 오른 황제로서의 위엄을 세웠다는 뜻이다.
3. 쌍절곤(雙節棍) 발명
중국에서는 전투에서 사용하는 병기(兵器)를 ‘기계(器械)’라고 하는데, 이에는 도(刀), 곤(棍), 검(劍), 창(槍)이 있다. ‘쌍절곤(雙節棍)’은 이 중에서 ‘곤(棍)’에 속하는 “두개의 짧은 막대기를 부드럽고 강한 끈으로 연결하여 자유자재로 휘두르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기”로 조광윤이 발명했다. 조광윤이 후주의 하급무장으로 있을 때 쌍절곤을 처음 만들었는데, 후에 ‘삼절곤(三節棍)’과 ‘초자곤(梢子棍)’ 등 다절곤(多節棍)으로 발전시켜 병사들에게 보급해 후주의 군사력 증강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조광윤이 황제가 된 후 송나라 군사들에게도 널리 보급해 당시 유행했던 병기가 되었다. 송나라 때는 ‘대반룡곤(大盤龍棍)’으로 부르다가 요즘에 와서 대소자(大掃子), 소소자(小掃子), 소반룡곤(小盤龍棍) 등으로 부르게 되었는데, 일반적으로는 ‘쌍절곤’이라 부른다. 송나라 당시에는 한 쪽은 길게, 다른 한 쪽은 짧게 만들어서 전투할 때 적군과 적의 말을 공격하는 데 효과적인 무기로 사용했다. 그리고 약 400년 전 일본 오키나와(沖繩) 도주(島主)는 백성들이 저항할까 두려워 창칼을 휴대하는 것을 금지시켰다고 한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조광윤이 창안해낸 쌍절곤이었다. 생각지도 못하던 이 작은 물건은 치고, 찌르고, 막고, 비틀고 할 수 있어서 그 위력은 대단했다고 한다. 이후 한국, 일본, 필리핀 등으로 전해지면서 전투에서는 물론 호신용 무기로 이용되었고, 1970년대 홍콩배우이자 무술인 이소룡(李小龍)이 영화에서 이 쌍절곤을 사용하면서부터 널리 알려졌다. 쌍절곤은 응용기술의 폭이 넓고 다양해 그 위력은 실로 대단하다. 이와 같이 조광윤이 소림권을 발전시켜 창안해낸 ‘태조장권’은 오늘날 중국의 대표적 권술 중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고, 그가 창안해낸 ‘쌍절곤’은 중국의 대표적 무예기계 중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