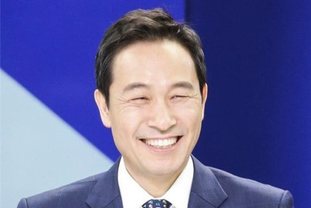2. 사형은 신중하게: 친아들 죽인 마종기(馬從記)
조광윤이 황제에 등극한 이듬해의 일이다. 금주(金州) 안강군(安康郡)에 마종기(馬從記)라는 사람이 아내가 일찍 죽자 아들 마한혜(馬漢惠)와 살고 있었다.
후에 마종기는 한 과부와 재혼했는데, 데리고 온 아들이 있어 이름을 마재종(馬再從)이라 지어주었다. 마종기의 친아들 마한혜는 장성한 후 제멋대로 날뛰면서 나쁜 짓들을 골라하고 다녔다.
이를 보다 못한 계모의 아들 마재종이 여러 번 타이르자 마한혜는 그를 죽이고 말았다. 이에 격노한 마종기는 일가족과 상의한 후 후처와 함께 친아들 마한혜를 죽였다.
대의를 위해 친자식을 죽인 마종기는 봉건사회에서는 절의(節義)가 있는 사람으로 취급되고 마을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되었지만, 그것은 분명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였다.
법률로 놓고 볼 때 마종기는 살인죄를 범했고 법에 따라 응당 참수형을 당해야 했다. 금주방어사 구초(仇超)와 판관 좌부(左扶)는 마종기와 일가족을 체포하여 살인죄로 모두 참수했다.
금주에서는 마종기사건에 대해 논쟁이 분분했다. 이 소문은 조정으로 퍼졌고 송태조 조광윤의 귀에 들어갔다. 그는 금주관청의 판결에 대해 크게 질책했다.
「대의를 위해 아들을 죽인 것인데 어찌 사형에 처할 수 있단 말인가?」
마종기는 법에 의해 죽어 마땅한 아들을 죽였는데, 다만 법적 권한이 있는 관청에서 죽이기 전에 자신의 손으로 먼저 죽인 것이 문제였다.
금주관청이 시비를 불문하고 마종기 일가족을 사형에 처한 것은 법을 안일하게 적용한 것이고 잔인무도한 짓이었다. 조광윤은 인명을 초개 같이 여기고 임의로 사형선고를 한 구초와 좌부를 장형(杖刑)을 친 후 섬으로 유배했다.
금주사건을 통해 조광윤은 각지에서 사형을 선고할 때는 반드시 신중을 기함으로써 인명을 경시하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형의 양형문제는 절차를 규범화해야 한다고 생각한 그는 금주사건을 불공정하게 비합리적으로 처리한 문제와 관련해 조령을 내렸다.
「대죄를 지어 사형에 처해야 할 범인은 소속되어 있는 주(州), 군국(軍鞫) 군국(軍鞫): 죄상을 실제로 조사, 검증하는 부서로 지금의 검찰과 경찰에 해당한다. 에서 처리하되 마음대로 처형해서는 안 된다.」
노자(老子)는 도가(道家)의 인자한 마음을 갈파한 사람이지만, 극악무도한 자에 대해서는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면, 피의자의 인권이 중요하다고 하여 무고한 사람을 말로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잔인한 수법으로 처참하게 죽인 범죄피의자의 얼굴마저 보이지 않게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흉악범들은 비록 법의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일벌백계의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는 얼굴을 공개해야만 유사한 범죄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사법기관에서 피의자를 잘못 체포하여 무고하게 얼굴이 공개되었다면, 물론 극소수이겠지만 정부에서 공권력을 잘 못 행사한 대가로 마땅히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한편 그 일을 잘못 처리한 사법관리들에게는 합당한 행정처벌을 가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법관리들의 일처리도 그만큼 신중해지고,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의 인권도 존중될 것이다.
우리가 소수 범죄자들의 알량한 인권을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얼굴마저 공개하는 것을 꺼린다면, 이는 본말(本末)이 전도(顚倒)된 처사로서 우리 사회에 흉포하고 잔학한 범죄행위를 방조하여 수많은 선량한 국민들을 범죄공포에 떨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입법(立法) 자체도 중요하지만 법률 집행에 있어서 운용의 묘를 기하는 사법(司法) 실천이 절실하다고 본다.
봉건사회에서는 황제가 바로 법률이고 황제는 법 위에서 사는 사람이다. 이러한 체제 하에서 관리의 법제의식은 약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황제의 말을 최고의 법으로 간주했다.
금주사건을 처리한 후 송태조가 마음대로 사형을 집행하지 말라는 조령을 내리자 각 지방의 사법심판관들은 조심스럽게 사건을 다루게 되었고 사건에 대한 판결을 감히 내리지 못했다.
많은 사건들을 직접 황제에게 아뢰고 황제의 재량을 요구하는 바람에 한 극단(極端)에서 다른 한 극단으로 바뀌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러한 ‘복지부동(伏地不動)’ 현상에 대해 조광윤은 한심하기 짝이 없었고, 그를 난처하게 만들었다.
그는 지방관리들이 법제의식이 없고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무조건 황제의 말을 법으로 삼는데 대해 화가 났다.
그리하여 송태조 조광윤은 각 지방관청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내리고, 또 사법부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령을 내렸다.
「법에 근거해 형벌을 판정하되 사건처리를 회피하고 무조건 상소를 올려 황제의 재량을 요구하는 것을 금하며, 위반한 자는 정직처분을 하라.」
삼국시기에 유비(劉備)와 간옹(簡雍)이 법제(法制)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
당시 촉(蜀)나라는 가뭄피해를 입어 농사를 망치게 되었다. 이에 금주령(禁酒令)을 내린 유비는 “술을 허가 없이 만드는 자가 있으면 형벌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한 관리가 민가에서 술을 빚는데 쓰이는 기구를 찾아냈는데, “이것은 술을 빚는 것과 똑같이 죄를 물어야 한다.”고 상주했다.
이러한 불공평한 처리를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 간옹은 유비와 함께 출타했을 때, 길을 가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하고 유비에게 말했다.
「저 자는 간음을 하려는 놈인데 왜 체포하지 않습니까?」
유비가 물었다.
「어떻게 저 자가 간음을 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오?」
간옹이 정색을 하며 말했다.
「이 자는 몸에 음란한 기구(음경)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 술 빚는 기구가 있다 하여 술을 빚으려 한다고 취급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유비는 간옹의 말뜻을 알고 파안대소했다. 그래서 술 빚는 기구를 가지고 있던 자를 석방했다. 법망을 이용해 법을 어기는 행위가 있는 것은 법규의 해석이 건전하지 못하거나 빈틈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