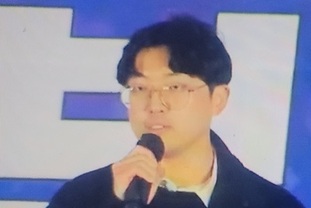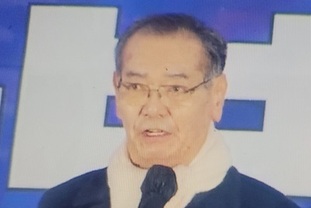새로운 왕조가 수립되자 그동안 밀렸던 정사며 쇄신해야 할 일 들이 산더미처럼 밀려들었다. 만일 황제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면 백성의 기대를 저버리고 나라에 치욕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조광윤은 명백히 알고 있었다.
후주의 정치기반 위에 수립된 송조(宋朝)는 오대(五代) 시기의 단명한 5개 왕조를 이은 왕조로서 그 기반이 약했기 때문에 일부 번진(藩鎭)과 신하들이 아직 완전히 굴복하지 않았고, 과거의 전철을 다시 밟을 액운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새로운 송왕조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했을 무렵, 전 왕조의 신하들과 개국공신들과의 갈등이 선결해야 할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조광윤이 예민하게 느낀 바와 같이 이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하여 대립이 악화되거나 격변이 일어나게 되면 그의 어머니 두태후(杜太后)가 말한 대로 ‘다시 필부(匹夫)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었다.
조광윤은 전에 후주 금군의 최고통솔자였고 또 수년간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겪어 왔다. 그는 오대(五代)시기에 끊임없이 왕조가 바뀌게 된 원인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하나는 황제가 어리석고 약하기 때문이었고, 둘째는 신하가 너무 강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군을 통솔하는 장수들이 군권을 이용하여 쉽게 권력을 찬탈하고 군주를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왕조가 빈번히 교체되었던 것이다. 송태조 그 자신도 바로 이 때문에 이득을 본 것이다. “물은 배를 띄우지만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당태종(唐太宗) 이세민(李世民)의 말은 과연 틀리지 않는 말이다.
조광윤은 병권에 의해 황제가 되었다. 그의 앞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도 바로 군 통솔자들이 병권을 이용해 황제를 능멸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었다.
당시의 시대조건 하에서 조광윤은 많은 것을 겪었기 때문에 군대는 정국을 좌우하는 근본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당시의 상황에서 황제든 할거정권이든 심지어 지방절도사까지 모두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자본으로 각기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후진의 성덕(成德) 절도사였던 안중영(安重榮)은 당시의 정권교체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황제의 자리는 강대한 군대를 가진 자의 것이며 용감한 자의 것이다.」
송나라 사람 범준(范浚)도 가차 없이 지적했다.
「오대(五代)에서 천하를 얻은 자는 다 병권에 의해서였다. 병권이 있으면 번창하고, 병권을 잃으면 곧 멸망한다.」
이른바 정권을 뒤흔드는 병권이란 나라를 장악한 군대를 가리킨다. 오대시기의 나라의 군대는 금군이었으며, 금군은 번진의 지방군대에서 탈바꿈한 것이었다.
당나라 중기 이후 중앙의 군대체제가 무너지는 바람에 각지의 절도사들은 너도나도 직업군인을 징모했다. 군대에 입대하는 것은 어려운 농민들의 살 길이 되었고, 할거전쟁이 치열해질수록 병사의 수요가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군인은 점점 세습하는 직업으로 바뀌었고, 힘센 병졸이 장수를 죽이고, 힘센 장수가 군주를 배신하는 풍조가 성행했다. ‘안사의 난(安史之亂)’ 이후 번진들은 각자 강대한 병력을 키워갔고, 중앙군의 세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됨으로써 할거정권의 혼전이 빚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