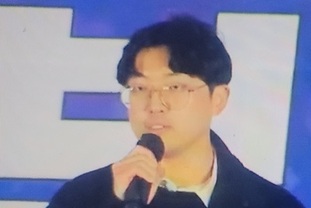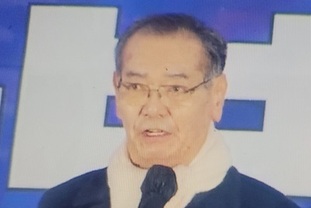조광윤 가문은 당말(唐末) 고조부 이래 대대로 지방관리(地方官吏)를 지냈지만 권세는 그리 대단하지 않았다. 당나라가 망한 후 절도사를 비롯한 군벌에 의해 왕조가 수없이 바뀌고 임금과 신하 간에 알력이 끊이지 않았던 시기에는 그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 시기의 중앙 고위관리들은 정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쉽게 죽음을 당했기 때문이다. 평탄하고 그리 눈에 띄지 않은 조상들의 벼슬은 정권찬탈의 늪에서 벗어나 조광윤의 가정을 지켜 주었고, 생활은 넉넉지 않았지만 그는 비교적 안정된 가정분위기 속에서 꿈 많은 소년시절을 보낼 수 있었다. 이러한 관료가문이라는 배경은 소년 조광윤에게 학문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고 성격 형성에 좋은 영향을 미쳤으며, 후일 황제가 되고 난 후에 ‘문인정치’를 실현하는데 사상적 밑거름이 되었다.
정사(正史)의 기록은 아니지만 중국의 각종 자료에 의하면, 조광윤의 5대조(五代祖)는 당나라 때 도교(道敎)의 높은 경지에 이르렀던 도인(道人) 조현랑(趙玄朗)이다. 조광윤 집안은 도교와 관련이 많은데 이는 아마도 조현랑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다. 조광윤의 숙부 조경청(趙景淸)은 출가하여 태원에 있는 청유관(淸油觀)의 도사(道士)로 있었다. 조광윤은 군사전략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정책에서 도가사상(道家思想)을 바탕으로 삼았다. 그의 동생 조광의는 태종이 되어 궁 안에 상청궁(上淸宮)이라는 도관(道觀)을 설치할 정도로 도(道)에 심취했다고 한다. 송태종 말년의 연호는 “도(道)에 이른다.”는 의미의 ‘지도(至道)’인데 3년간 시행되었다.
『송사(宋史)』「태조본기(太祖本紀)」는 조광윤이 탁군인(涿郡人)이며, 고조부 조조(趙脁: 828~874)가 당말(唐末)에 영청(永淸), 문안(文安), 유도(幽都) 등 세 곳의 현령(縣令)을 지냈다는 내용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조광윤은 황제가 되고난 뒤 그를 희조(僖祖)로 추존했다. 당대(唐代)의 현령은 6품에서 7품에 해당하는 지방관리로, 그가 현령을 지냈던 세 곳은 모두 본적지 탁군(涿郡) 인근지역이었다.
조광윤이 순조(順祖)로 추존한 증조부 조정(趙挺: 851~928)은 절도사 세력이 강성하던 당말에 가장 세력이 크고 탁군을 관할하던 유주(幽州)절도사 휘하의 문관이었다. 그는 후일 중앙조정에 진출해 정5품에 해당하는 어사중승(御史中丞)까지 했다. 아마도 조광윤 가문은 이때부터 본적지를 떠나 외부세계인 당시의 수도 장안(長安)으로 보금자리를 옮겨 발전의 기반을 갖추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광윤이 익조(翼祖)로 추존한 조부 조경(趙敬: 872~933)은 당말에 영주(營州), 계주(薊州), 탁주(涿州) 등 세 주의 자사(刺史)를 지냈다. 고조부가 탁주 부근의 세 곳 현령을 지낸데 비해, 그의 조부는 탁주를 포함한 세 곳 자사를 지냈으니, 조광윤가문으로 보아서는 2대를 거치는 동안 벼슬이 한 단계 높아진 셈이다. 한편 절도사부(節度使府)의 속관(屬官)을 지낸 그의 증조부와 비교하여 볼 때, 조부는 당당한 지방장관이었다. 자사는 정4품에서 종3품에 해당하는 주(州) 단위의 지휘관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일설에 의하면, 그의 조부 조경은 당나라가 망한 후 후량조정에서 고관으로 있었기 때문에 후당의 이존욱이 후량을 멸하면서 한 때 화를 입게 될 위기에 처했었는데, 그의 아들 조홍은(趙弘殷: 899~956)이 후당 건국에 공로가 있어 다행히 화를 모면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때 조경이 화를 피해 낙양 교외의 협마영(夾馬營)으로 옮겨감으로써 그때부터 조광윤가문은 그곳에서 정착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조경은 후주 세종 때에 군공(軍功)을 세운 아들 조홍은의 영향으로 상효기위상장군(上驍騎衛上將軍)으로 추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