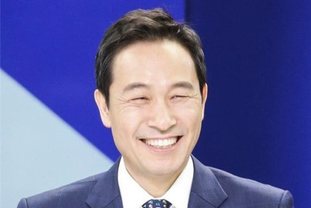6. 황제의 언행을 모두 기록으로 남기게 하다
송태조 조광윤은 문인정치를 실시함에 있어서 역사서적을 편찬하는 것도 주요 사업으로 추진했다. 974년(태조15) 10월에 지제고(知制誥)이며 사관편수찬(史館編修撰)인 호몽(扈蒙)이 상소문을 올렸다.
「지난 시기 당문종(唐文宗)은 대신들을 불러 국사를 논할 때 반드시 기거랑(起居郞)이나 측근에게 명하여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문종실록(文宗實錄)』은 오늘날 가장 상세하고 완벽한 문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후에 당명종(唐明宗)도 단명전학사(端明殿學士)와 추밀직학사(樞密直學士)에게 명하여 교대로 『일력(日歷)』을 적게 하여 사관(史館)에 수장했습니다.
근대에 와서 이러한 작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비록 계절마다 내정의 『일력)』을 추밀원(樞密院)에서 기록해 사관(史館)에 보내지만 기록된 내용은 회견이나 의식 등일 뿐 황제의 언행이나 거동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누설의 혐의가 두려워 감히 말하지 못하거나 사관(史官)이 벽을 두고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부터는 궁궐에서 일어나는 모든 국사의 결정, 우려와 동정의 언사 등은 모두 책자로 편집하되 재상, 참지정사(參知政事), 대신에게 명하여 달마다 교대로 기록하게 함으로써 사관이 편집할 수 있게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호몽은 당대(當代)의 송나라 국사를 편찬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는 제도를 수립할 것을 제안했던 것이다. 문인정치를 실시하고 역사를 통해 사건을 논하기 좋아하는 조광윤으로서는 당연히 그의 합리적인 제안에 찬성했다.
그는 내정의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고 후세 사람들에게 참고할 경험을 남겨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흔쾌하게 동의하고 비준했다.
이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조광윤은 특별히 자신이 기용한 노다손에게 이 일을 맡겼다. 여기에서 조광윤은 광명정대하고 투명한 정치를 펼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황제로 즉위할 당시 조광윤이 전당에 앉아 모든 문을 활짝 열어놓게 하고 다음과 같이 한 말을 연상할 수 있다.
「언제나 대전(大殿)의 문을 활짝 열어 놓아, 국정을 처리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왜곡됨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송태조 조광윤은 이러한 투명한 일 처리방식과 올바른 품성으로 언행이 일치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 후 설거정(薛居正)이 새로 편찬한 150권의 『오대사(五代史)』를 조광윤에게 올렸다. 그는 공무처리 관례대로 사관(史館)에 수장할 것을 비준하는데 그치지 않고 당일 밤늦도록 서두 부분을 친히 읽어보았다.
그 다음날 그는 재상과 신하들에게 독후감을 얘기했다.
「어제 새로 편찬한 『오대사』를 읽고 후량(後梁)의 주전충이 그토록 폭정을 일삼고 추악한 행태를 부린 것을 알게 되었소. 그와 같은 인간은 천벌을 받아 마땅하오.」
유가경전과 역사서를 널리 탐독한 조광윤은 당태종(唐太宗) 이세민(李世民)이 신하들의 간언을 잘 받아들였다는 대목을 읽고 황제가 솔선수범해야 하는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대신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옛날 황제들은 처신을 바르게 하고 스스로 과오를 시정하는 자가 많지 않았다. 짐(朕)이 늘 조석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금욕(禁慾)할 수 있을까? 덕(德)으로써 사람들을 교화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당태종은 간언을 받아들여 자신의 실책을 바로잡고 그렇게 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았다. 그렇다면 황제가 실책을 저지르지 않고 신하들이 간언을 올리지 않게 할 수는 없는가? 그러니 항상 황제는 이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조광윤은 당태종(唐太宗)이 간언을 잘 받아들인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그리 권장할 것이 못된다고 생각했다.
허심하게 간언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만일 교만하지 않고 자신을 억제해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신하들이 간할 거리가 없을 것이니 더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했던 것이다.
후촉에 구양형(歐陽炯)이라는 재상이 있었는데, 송나라가 후촉을 멸망시킨 후 후촉왕 맹창(孟昶)을 따라 경성에 왔다. 조광윤은 그를 한림학사로 임명했다.
성격이 자유분방한 구양형은 피리를 잘 불었다. 조광윤은 그를 황궁으로 불러 한 곡을 연주하도록 명했다. 곡이 끝나자 조광윤이 말했다.
「짐(朕)이 듣건대 맹창과 신하들은 성악(聲樂)에 푹 빠져 있었다고 들었소. 재상직에 있은 경(卿)도 피리 부는데만 심취하는 바람에 우리에게 생포당한 것이 아닌가? 경은 한림학사가 되었으니 더 이상 성악에 빠지지 말고 나라와 백성의 일에 신경 쓰도록 하시오.」
이것도 그의 문인정치의 풍모를 보여준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송태조 조광윤은 성악과 쾌락에 빠진 자들을 곱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악 전공자들에 대해서도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을 중용하지 않았다. 성악을 주관한 교방사(敎坊使) 위덕인(衛德仁)이 연로해 후당 장종의 예를 들면서 지방장관직을 요구했을 때, 조광윤은 단호히 거절하며 말했다.
「광대를 자사(刺史)로 임용한 것은 장종의 실책이었는데 어찌 그것을 따라한단 말이오?」
오대시기 후당의 장종 이존욱은 용맹했으나 어리석은 황제였다. 그는 배우를 아끼고 신뢰했다. 유년시절부터 연극을 좋아했던 그는 황제가 된 후에도 분장을 하고 수시로 배우들과 어울려 무대에서 연극을 공연해 별호를 ‘이천하(李天下)’라 불렀다. 어느 때인가 한번 연극을 할 때 그는 무대에서 “이천하!, 이천하!”를 외쳐댔다.
그러자 한 배우가 달려들어 그의 뺨을 때리면서 욕했다.
「‘이천하(李天下)’는 하나밖에 없는데, 어찌 두 번 부르느냐?」
이존욱은 뺨을 얻어맞고도 기뻐하며 그 배우에게 후한 상금을 내렸다. 그는 배우를 신뢰했기 때문에 배우를 번진의 감군(監軍)으로 임명하고 궁내의 여러 직책에도 문관을 쓰지 않고 모두 배우로 충당했다.
그리하여 재위한지 4년을 못 채운 그는 수십 명의 배우들로부터 협공당하는 속에서 총애하는 배우 곽종겸이 쏜 화살을 맞고 목숨을 잃고 황제의 자리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해 세간의 웃음거리로 남게 되었다.
후에 재상 조보가 위덕인을 상주사마(上州司馬)로 임명할 것을 상주했으나 송태조 조광윤은 여전히 동의하지 않았다.
「그 자리는 문관이 있어야 할 자리요. 자질이 우수한 자를 임용해야지 경솔하게 그런 사람을 쓸 수는 없소. 그 사람은 악부(樂部) 내에서 자리를 하나 주면 될 것이오.」
조광윤의 반대로 위덕인은 태상시(太常寺)에서 대악서령(大樂署令)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역사상 용맹을 떨쳤던 개국황제들을 보면 최초에는 모두 영명했으나 유종의 미를 거둔 자는 매우 적다. 문인정치를 힘껏 추진해 온 조광윤은 마침내 주의 사마급(司馬級) 관원들까지도 모두 문인으로 임명하였다.
여기에서 그의 엄격한 통치면모를 엿볼 수 있다. 이것은 조광윤이 힘을 다해 나라를 다스리고 시종 영명하게 일처리를 했으며, 마지막까지 교만하지 않고 사치한 것을 추구하지 않았으며 성현의 도덕으로 자신을 엄격히 관리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역사는 자신이 쓰는 것이다. 다른 사람은 대필하여 기록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