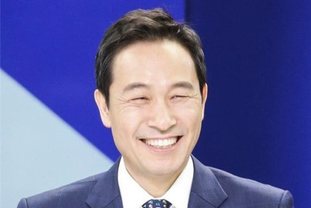2. 지식인을 존중하고 제도적으로 보호
송태조 조광윤은 문인정치를 실시하고 오대(五代)시기 이래 군인들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정치국면을 바로 잡으려고 애썼다.
그는 무장들의 정치참여를 억제하고 문인의 등용을 강력하게 추진해 문인정치를 치국의 목표로 삼았다.
조광윤이 문인을 많이 등용하고 중앙과 지방의 각급 정부에 문인들을 임용하면서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점차적으로 문인이 아니면 관직에 등용될 수 없는 정치적 국면이 형성되었다.
이어 조광윤은 말했다.
「문인이 횡령하고 나쁜 짓을 한다 해도 군인들의 십분의 일에 불과하다.」
이 말은 피상적으로는 문인을 편애하는 것 같지만, 문인이란 공부해 지식을 얻은 사람들로서 그들이 배운 지식은 과거(科擧)의 학과(學科)들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모두 성현들의 가르침인 것이다.
중국의 성현들은 모두 도덕을 기반으로 하여 인의(仁義)의 견해로 도와 덕을 해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인들이 학습하는 성현들의 책에는 횡령이나 독직의 내용이란 찾아볼 수가 없다. 예컨대 공자(孔子)는 이렇게 말했다.
「부유함과 벼슬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이나 정당한 도로써 얻은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누리지 말아야 한다. 군자는 밥 먹는 동안이라도 인(仁)을 어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 황급한 때에도 그래야 하고 생활고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때에도 그래야 하느니라.」
이는 과거시험의 필독서인 『논어(論語)』 중의 공자가 한 말이며, 과거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명제(命題)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의 이치를 깊이 이해한 사람이라면 횡령한 일이 있다 해도 최소한 그것은 인의(仁義)의 이치에 어긋나며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성현의 책을 읽은 적이 없는 무인들은 대다수가 비도덕적인 일을 저지르고도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조광윤은 문인을 믿었고 문인의 탐욕심이 무인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작다고 생각했다.
설령 문인이 도덕에 어긋나는 일을 했다 해도 그는 그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은 묵인해 주려고 했다. 그러므로 조광윤은 언제나 문인에 대해 관용을 베풀었다.
재상 조보(趙普)가 오월왕(吳越王)이 보낸 열개의 병 안에 든 금(金)을 받은 것을 알았을 때도 조광윤은 웃으며 말했다.
「경(卿)이 받은 것은 무방하오. 그들도 나라의 대사는 다 경(卿)과 같은 문신이 처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후한 선물을 보낸 것이오.」
조광윤은 결코 조보와 막역지우이기 때문에 신하가 뇌물 받은 것을 묵인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문인과 학자에 대해 관용과 사랑을 베푼 것이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뇌물의 성격을 바꾸어 조정에서 하사(下賜)하는 상금으로 취급했던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오월왕이 편지에서 쓴 국가의 대사는 다 문신이 주관한다는 말에 대해 조광윤은 흐뭇해한 것이다.
그는 다른 나라가 그의 문인정치를 알아 줄 것을 바랐고 또 조보와 같은 문인공신들의 보좌에 의해 성과와 명예를 거둔데 대해 기쁨과 위안을 느꼈기 때문이다.
송나라 초기에 송태조 조광윤이 지식인을 중용하고 그들이 나라를 관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식인의 지위도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되었다.
송태조의 후기에는 조보, 이처운, 유온수, 구거윤, 여여경, 설거정, 신중보, 단사공 등 문신들을 중용하여 중앙 또는 지방의 요직을 맡게 했고 또한 노다손(盧多遜)을 부재상(副宰相)인 참지정사(參知政事)까지 오르게 했다.
노다손은 후주의 진사로서, 송나라 초기에 지제고(知制誥), 지공(知貢) 등의 요직을 역임했다. 971년(태조12)에 한림학사로 승진되었다.
총명하고 문장이 출중한 그는 경전들을 널리 섭렵했다.
그런데 후세에 그가 잔머리를 굴리는데 능하다고 평한 사람도 있다.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된 데는 노다손이 확실히 총명하고 다른 사람이 생각해내지 못한 묘리(妙理)를 생각해냈기 때문이다.
송태조 조광윤이 독서를 좋아하고 늘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는다는 말을 들은 그는 도서관의 관리를 매수하여 황제가 읽는 책의 이름을 알아낸 후 같은 책을 찾아 집에서 밤새도록 읽으면서 내용을 암기했다.
그리하여 조광윤이 대신들에게 읽은 책의 내용을 들먹일 때마다 그는 언제나 거침없이 대답할 수 있었다. 조광윤은 그의 재능을 높이 평가해 그에게 중임을 맡겼던 것이다.
송태조 조광윤은 스스로 글 읽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조신(朝臣)들이 글 읽는데 대해서도 기쁘게 생각했다.
노다손이 그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같은 책을 찾아 읽는 등, 잔머리를 쓰기는 했지만 어쨌든 책을 읽고 깊이 이해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비난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 상황을 알게 되었다 해도 사리에 밝은 조광윤은 그를 나무라지 않았을 것이다.
“재상은 공부한 사람을 써야 한다.” 이 말은 본래 조광윤이 깊이 느껴서 한 말이었는데 후에 과연 그것을 재상을 발탁하는 원칙으로 삼았다.
조광윤의 총애를 받은 조보(趙普)도 공부를 많이 해야 했고, 책 읽기를 좋아한 노다손은 부재상(副宰相)이 되었고, 송태종 때에는 평장사(平章事)로서 재상까지 오르게 되었다. 노다손은 『개보본초(開寶本草)』 등 훌륭한 저서를 저술했는데, 송태종 당시 981년(태종6) 재상 조보와 알력이 생겨 조보를 태종에게 고발해 태종이 조보를 소원하게 대하게 되었다.
그에 앙심을 품은 재상 조보는 982년(태종7) 노다손이 송태종의 동생 조광미와 결탁해 반역을 도모한다고 고발해 조광미는 경성의 행정장관인 서경유수(西京留守)에서 방주(房州)지주로 좌천되었고, 노다손은 지금의 해남도(海南島)인 애주(崖州)로 귀양 가서 3년 후 985년(태종10)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
후에 임명한 재상들도 모두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었으며, 송나라 초기에 문인들이 대거 임용되면서 조정은 막강한 문인세계로 바뀌었다.
송태조 조광윤은 문인을 중용함에 있어서 옛 왕조의 신하든 지금의 신하든, 벗이든 원수이든, 정견이 같든 다르든 막론하고 문화지식만 있으면 모두 능력에 따라 등용했다. 두의(竇儀)의 예는 이 점을 잘 말해 주고 있다.
후진 시기의 진사인 두의는 후한, 후주의 관직을 두루 역임했다.
당시 후주의 장군이었던 조광윤이 저주(滁州)를 공략하자 후주의 세종은 두의를 저주에 파견해 남당군이 남긴 재물을 관리하게 했다.
그때 조광윤은 창고에 있는 비단 몇 필을 요구했다가 두의로부터 거절당한 적이 있었다. 조광윤은 두의가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데 대해 불쾌해 하거나 원망하지 않았고, 송나라를 세운 후에는 오히려 그를 공부상서(工部尙書), 판대리사경(判大理寺卿)으로 중용했다.
또 그를 단명전학사(端明殿學士)로 승급시켰으며 한림학사(翰林學士) 직을 복원하게 하여 『송형법(宋刑法)』을 개정하게 했다. 여기에서 조광윤은 사적인 일에 얽매이지 않고 부단히 문인을 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광윤은 두의에게 한림학사직을 임명한 후 어느 날 그를 궁에 불러 서신을 작성하게 했다.
두의가 원문(苑門)에 당도했을 때 조광윤이 두건을 두르지 않고 맨발 바람으로 대전(大殿)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문 밖에 서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좌우의 시종들이 빨리 어전 안으로 들라고 재촉했으나 그는 여전히 머뭇거리며 들어가지 않았다.
조광윤이 좌우를 시켜 이유를 물었더니 황제의 몸차림이 엄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때서야 조광윤은 비로소 이 지식인은 성품이 고결하고 모든 것을 규칙에 맞게 하려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때 그의 뇌리에는 두의를 남당에 사절로 보냈던 일이 스쳐지나갔다.
남당의 궁정에 도착한 두의가 황제의 조서를 낭독하려 하는데 마침 눈비가 내려 사람들의 옷을 적시고 있었다. 남당왕 이경(李璟)은 행랑 밑에서 조서를 낭독하게 함으로써 의식을 대충 끝내고 사람들이 눈비를 피하게 하려고 했다.
그런데 두의는 이러한 호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관례대로 정원에서 정중히 황제의 조서를 받도록 하고는 정색을 하고 말했다.
「저는 송나라 조정을 대표해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의 규칙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일 제가 비를 맞을까봐 정원에서 조서를 받지 않는다면 다음 날에 다시 와서 조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당왕은 하는 수 없이 정원에서 눈비를 맞으면서 조서를 받아야했다.
이 사실들은 송태조 조광윤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했다. 그는 관대(冠帶)를 단정히 차려 입은 후 두의를 불러들였다.
어전에 들어선 두의는 황제에게 간언을 올렸다.
「대업을 이루신 폐하께서 천하와 상대할 때는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방금처럼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호걸들이 듣고 와해될까봐 두렵습니다.」
조광윤은 그의 간언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 후부터 측근을 만날 때에도 옷차림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조광윤은 두의를 재상으로 임명하려 했으나, 뜻밖에 그는 966년(태조7)에 53세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못내 아쉬워하며 말했다.
「하늘이 왜 이렇게 빨리 두의를 빼앗아간 것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