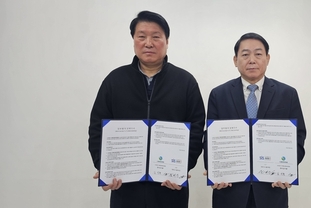2. 세 줄의 유훈(遺訓) 「서약비(誓約碑)」
역사서에 송태조 조광윤이 유생(儒生)을 비롯한 지식인에 대한 존경을 표하기 위해 특별히 궁내에 융유전(隆儒殿)을 설립했다는 기록이 있다.
962년(태조3) 조광윤은 사람을 시켜 비밀리에 비석을 새기게 하여 침전의 협실에 보관하고 이름을 ‘서비(誓碑)’라고 명명했다.
그는 이 서약비(誓約碑)에 금박 입힌 노란 휘장을 덮어놓고 철저히 지키도록 했다.
그는 친히 유관 부서에 지시해 이 서약비는 누구에게도 보여주어서는 안 되며, 제사의식이나 새 황제가 등극할 때 유관부서에서 반드시 황제에게 주청을 올려 이 서약비를 읽도록 하라고 했다.
그는 또 황제가 비문의 서약을 읽을 때는 반드시 글을 모르는 어린 내시가 수행해야 하며 관리들은 멀리 정원에 서 있어야 하고 황제는 혼자 꿇어 앉아 속으로 묵독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같이 신비하고 장중한 참배의식은 몇 대(代)를 내려오면서 신하들과 시종들은 그 비문에 어떤 서약이 쓰여 있는 것만 알았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
마침내 금(金)나라 군사가 침입해 변경(汴京)이 함락되어서야 이 서약비의 면모가 세상에 드러났다.
이 서약비에는 간단하게 세 줄의 내용이 있었다.
1. 시씨(柴氏) 시씨(柴氏): 후주(後周)의 세종(世宗) 시영(柴榮)
자손이 죄를 지어도 형을 가해서는 안된다. 역모를 꾸민
종범(從犯)은 옥중에서 자진하도록 하며, 저자거리에서 죽이지 말아야 하고
연좌죄(連坐罪)를 묻지 말아야 한다.
2. 사대부(士大夫)와 글을 올린 자를 죽여서는 안된다.
3. 자손들은 이 서약을 근엄하게 지켜야하며, 어기는 자는 하늘이 반드시 천벌을
내릴 것이니라.
이 신비한 석비(石碑)는 사실상 두 가지 일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하나는 “사대부와 글을 올린 자를 죽이지 말라.”는 것이다. 사대부(士大夫)란 황제가 친히 그 관직을 임명한 자를 가리킨다. 글을 올린 자란 문관을 가리킨다. 말하자면 공신(功臣)과 문관(文官)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송태조 조광윤이 자신과 후세 사람들에게 확고히 정해놓은 기본국책이었다.
이것은 송나라를 위해 세운 천년지법이었고 송나라가 존재하는 이상 후손들은 반드시 지켜야 할 국법이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조광윤의 깊은 속마음을 헤아릴 수 있으며 문인에 대한 사랑이 역사상의 그 어느 황제보다도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그는 지식인들에게 일종의 ‘정치적 자유’를 주었고 활약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마련해 주었다.
이 서약비에 새겨져 있는 “글을 올린 자를 죽이지 말라.”는 말은 일종의 ‘언론자유’를 뜻하는 것이다.
황제나 조정에 올리는 글이 황제의 마음에 들든 안들든, 또는 조정을 질책하는 말이든 아니든 간에 다 죽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식인들에게 일종의 자유스러운 공간을 제공해 준다는 것임에 틀림없다.
이것은 한 나라의 개국황제로서 비밀스럽게 후대황제들에게 남기는 유훈치고는 예상 외로 너무 간단하고 욕심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서약비의 내용은 결국 “시씨(柴氏)와 문인을 존중하라.”는 것으로 그렇게 비밀스럽게 할 이야기도 아니다.
송태조 조광윤이 후대 황제들에게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라. 역적에 대하여는 저렇게 해라.
황위계승은 이렇게 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조씨(趙氏)가문이 시씨(柴氏)가문한테 은혜를 입은 것을 잊지 말라.
무인집권시기에 혼란으로 데었고 그렇게 하면 발전이 없으니 문인을 존중하라.”는 내용은 실로 질박한 도가적(道家的) 사상의 발현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중국역사상 송태조 이전에도 일종의 ‘언론자유’라는 것이 존재했었다.
일찍이 춘추전국(春秋戰國)시기에는 ‘백가쟁명(百家爭鳴)’을 주창하여 어떤 사상이나 어떤 정견이거나를 막론하고 흉금을 털어놓고 마음껏 말할 수 있었으며 옥에 갇히거나 참수당하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진시황(秦始皇)에 의해 나라가 통일을 이룬 봉건사회에 이르러서 유생(儒生), 도사(道士) 등 460여 명을 체포해 함양(咸陽)에서 생매장한 분서갱유(焚書坑儒)사건으로 상황이 달라졌다.
사실상 중국의 전반 봉건전제사회를 놓고 볼 때 언론자유란 존재하지 않았다. 송나라의 이 서약비에 언론자유라는 뜻이 내포된 외에 다른 왕조들은 다 언론을 통제했었다.
고려 태조 왕건도 943년 송태조 조광윤과 마찬가지로 후손들에게만 보여주라는 당부와 함께 귀감이 되는 ‘훈요10조(訓要十條)’를 유훈으로 남겼다.
조광윤은 사실상 두 가지 사항만 남겼는데 비해, 왕건은 훨씬 현실적이며 열 가지나 남겼다.
왕건은 ‘훈요십조’를 그가 총애하던 중신(重臣) 박술희(朴述熙)에게 비밀리에 건네주었다고 한다.
① 국가 대업이 제불(諸佛)의 호위와 지덕(地德)에 힘입었으니 불교를 잘 위할 것. ② 사사(寺社)의 쟁탈과 남조(濫造)를 금할 것. ③ 왕위계승은 적자적손(嫡子嫡孫)을 원칙으로 하되 장자가 불초(不肖)할 때는 인망 있는 자가 대통을 이을 것. ④ 거란과 같은 야만국의 풍속을 배격할 것. ⑤ 서경(西京)을 중시할 것. ⑥ 연등회(燃燈會), 팔관회(八關會) 등의 중요 행사를 소홀히 다루지 말 것. ⑦ 왕이 된 자는 공평하게 일을 처리해 민심을 얻을 것. ⑧ 차현(車峴) 이남의 금강(錦江) 밖은 산형지세가 배역(背逆)하니 그 지방의 사람을 등용하지 말 것. ⑨ 백관의 기록을 공평히 정해줄 것. ⑩ 널리 경사(經史)를 보아 지금을 경계할 것.
송태조 조광윤은 문인들의 책략에 의해 나라를 세우고 황제가 되었으며 또 문인들을 기용해 정치를 펼쳤기 때문에 천하는 평안했다.
서약비를 만들어 사대부와 글을 올리는 자를 죽이지 않도록 명문화했으며, 지식인의 언론자유를 위해 비록 춘추(春秋)시기와는 견줄 수 없으나 진(秦)나라 이후 중국봉건역사에서 최대한의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진나라가 급속히 멸망하고, 송나라가 급속히 부흥해 300년이 넘게 존속한 것은 문화에 대해 각기 다른 정책을 실시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