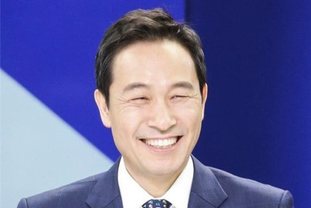3. 3개 사법기구(司法機構) 간 상호견제시스템
봉건전제사회에서의 법제는 제왕(帝王)이 자신의 의지를 반영하는 국가기구를 통해 수립하는 법률제도이다. 법률의 제정, 집행, 준수는 통치자가 독재를 실행하는 방법이며 수단이었다.
송나라는 건국 초기에 자체 법전이 없었기 때문에 당나라의 『당율(唐律)』과 후주의 『대주형통(大周刑統)』을 이용했다.
그리하여 비록 법률은 있었으나, 사법관은 법망의 틈새를 이용해 마음대로 사형을 선고하거나 직무에 태만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했다.
이리하여 법제를 운용하기 위한 적임자를 임용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사법권을 행사하는 관리가 법제관념이 확고하지 않으면 법을 잘 집행할리 만무하다. 송태조 조광윤이 아무리 수시로 조령을 반포한다 해도 근본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일련의 체계적인 법제도를 수립하지 않으면 안되며 법체제에 대한 일대 개혁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조광윤은 오대(五代)시기에 법을 모르는 무장들이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하는데 대해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그는 마음대로 사형을 선고하고 인명을 소홀히 다루는 잘못된 사법현상을 근절키 위해, 사법권을 중앙에 집중시키고 업무분장이 명확한 사법기구를 설치했다.
조광윤은 황제에 즉위한 후 그때까지 내려오던 당나라식 사법기구에 대해 개혁을 실시했다.
법 집행과정에서 생기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사법관인 대리사(大理寺)가 보다 신중하게 사건을 다루도록 ‘신형기구(愼刑機構)’로 개설하고, 감옥(監獄)은 어사대(御史臺)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신형기구(愼刑機構)’란 ‘조심하다, 신중히 하다’의 뜻을 지닌 ‘신(愼)’ 자에서도 송태조 조광윤의 본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조광윤이 대리사(大理寺)의 책임범위를 조정한 것은 사법기구 간 권한의 균형을 이루고 상호견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리하여 중앙의 사법기구는 사건의 판정을 맡는 대리사(大理寺), 재심사를 맡는 형부(刑部), 법 집행을 맡는 어사대(御史臺) 등 삼권(三權)이 서로 견제하는 구도를 이루면서 어느 한 사법기관도 단독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없게 했다.
송태조 조광윤이 도가(道家)의 인자한 마음으로 사법기구에 대한 개혁을 실시한 것은 후세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후일 금(金), 원(元), 명(明) 등의 후대 나라들이 다 이 법을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