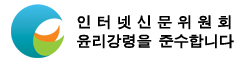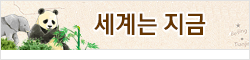(시사1 = 김재필 기자) 철원은 나에게 매년 겨울의 진객 두루미 촬영으로 익숙한 고장이다.
이번엔 눈이 내리는 계절이 아닌 진달래가 꽃 피고 곰취가 잎을 돋우는 4월에 그 곳을 찾았다.
금학산(947m)에 위치한 마애불을 탐사 하기 위함이었다. 철원 동승읍 평야에서 올려다 보면 삼각형 모양으로 뽀족하게 솟아 있는 산으로 커다란 두루미(학)가 힘찬 날개 짓으로 비상하는 모습을 닮아 금학산(金鶴山)이라 했다 하니 예나 지금이나 철원은 겨울철에 두루미(학이라는 말은 중국어 표기라고 철원에서 철새 촬영시 만난 조류학자 윤무부 박사가 조언해줌 )가 겨울을 나기 위한 서식지로 제격이었나 보다.
금학산은 태봉을 세운 궁예에겐 잘못 판단한 서글픈 사연을 간직하고 있다.
궁예가 개성에서 철원으로 수도를 옮길 때였다.
그는 고암산(북한 소재)과 이곳 금학산 중 어느 곳을 진산(鎭山)으로 해서 궁궐을 지을 것인지를 도선국사에게 물어 보니 “고암산에 지으면 단명할 것이나 금학산을 진산으로 삼아 궁궐을 지으면 국운이 300년 이상 계속될 것이요”라는 충고를 해 주었다.
그러나 궁예는 한갓 풍수쟁이의 말이 헛되다고 생각했는지 자신의 고집으로 금학산이 아닌 고암산 주변에 궁궐을 세웠다. 헌데 이변이 일어났다.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한 금학산은 몇 년을 울었고 이 산에서 나는 곰취는 써서 먹을 수가 없었다는 전설이 전해져 온다.
그래서인지 태봉은 건국 26년후 918년에 왕건에게 나라를 넘겨주고 지금은 ‘억새꽃 축제‘로 알려진 포천의 명성산(鳴聲山.울음산)에서 사흘동안 울었다 한다.
마애불은 산을 오르기 시작하여 30여분만에 도착한 금학산 7부능선쯤 위치로 금학산을 학으로 보았을 때 몸통의 꽁지쪽에 해당되어 학이 알을 낳는 생식기에 해당 되는 지점에 있었다. 풍수를 모르는 내가 봐도 명당자리로 보인다.
고려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마애불은 막 피어난 진달래꽃에 둘러 싸여 있었다.
신라말 고려초기엔 미륵사상이 백성들에게 깊게 심어져 있었다.
궁예는 이를 이용해 자신을 스스로 미륵불이라 칭했다. 이 곳 오는 길에 동송초교 앞에서 만난 어르신에게 들은 궁예와 마애불에 대한 구전(口傳)이 생각이 난다.
금학산이 우는 걸 안 궁예가 이 산의 명당자리에 자신을 상징하는 마애불을 조성하여 금학산의 슬픔을 달래 주었다는 것이다.
동남쪽 철원평야를 내려다보고 있는 마애불상은 전체 높이 5.76m, 불신 높이 4.5m, 머리 높이 1.3m로 거대한 화강암면을 이용하여 불상의 신체를 선각으로 표현하였고 불두는 별도의 바위돌에 입체감 있게 조각하여 몸체에 올려 놓았다.
입상의 형태로 수인은 왼손은 가슴 앞에서 시무외인(施無畏印)의 변형을 하고 있으며, 오른손은 아래로 늘어뜨려 여원인(與願印)처럼 보이지만 손등이 보이도록 표현하였다.
상체는 양 어깨를 덮는 통견이고 내의의 끈을 하나는 좌하향의 대각선으로, 다른 한쪽은 명치 쪽에서 양쪽 끈을 묶어 매듭을 표현하였다.
배꼽 아래로 옷 주름을 동심원 모양의 일정한 간격으로 조각하여 형식성, 도식성을 띤다. 상단부의 틈새로 상의의 옷깃을 여민 형상이다. 군의는 중간 이하 부분만이 상의 안쪽으로 보인다.
몸체는 전체적으로 양감과 부피감이 부족하다.
구전대로 궁예의 지시에 의한 숙련된 석공의 솜씨라기 보다는 신라말 후고구려를 거쳐 태봉국에 이르는 난세에 민초들의 삶은 위태위태하여 미래불을 기다리는 심정은 더 했을터, 아랫마을에 사는 석수쟁이의 평범한 솜씨로 조성된 민초들의 미륵세계를 염원을 담아 조성한 마애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자세히 보니 마애불바위가 15도 정도의 각도로 뒤로 젖혀져 있다. 고암산에 진산을 정한 태봉국이 오래가진 못할 것이라는 도선의 예언이 있었지만 금학산에 있는 마애불로 인해 태봉국이 다시 부흥해질 것을 염려한 왕건이 수백명의 부하들을 보내 마애불을 없애려 했으나 전체가 뒤로 조금 기울어졌을 뿐 끄떡도 했다니 마애불의 영험한 기운 때문이었을까?
마애불 촬영을 마치고 주위를 둘러보니 제법 넓은 공터에 옛 절터였는지 주위에 석탑의 기단으로 보이는 연화대좌 조각등이 널부러져 있다.
잠시 편편한 너럭바위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 보니 우리나라 곡창의 하나인 철원평야가 한 눈에 들어 온다. 농사준비를 위해 논에 담아논 물이 햇빛에 반짝거린다.
1,000년 동안 흘러내린 금학산의 눈물이 모인 것은 아닐까? 그 때마다 마애불도 같이 흘렸을지도 모른다. 역사는 인간이 만든다. 하지만 만든 역사 또한 인간이 무너뜨리니 우리문화를 되새기는데 주저함이 없어야겠다는 다짐을 마애불에게 삼배와 함께 해 보며 금학산을 내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