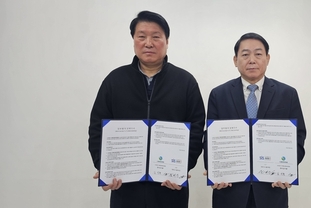5. 남당(南唐) 평정
군사나 정치에 있어서 크게 위협적일 경우 응당 문제의 사안을 중요시하여 집중적으로 주된 적을 공격해야 하지만, 크게 위협적이지 않은 적수에 대해서는 가만히 두었다가 적절한 시기에 없애버려야 손쉬운 법이다.
남당에 대한 조광윤의 태도가 바로 이러했다.
960년 1월에 등극해 970년(태조11) 초에 이르기까지 10년 동안 조광윤은 비록 북한 정벌은 무위로 돌아갔지만, 형남과 호남을 일거에 지혜롭게 탈취하고, 이어서 물산이 풍요한 후촉과 남한을 강점하고 거란과 호각지세(互角之勢)로 대항함으로써, 오대(五代) 이래 군사적으로 가장 큰 성공을 거두었다.
아직 북쪽에 작은 땅 북한과 남쪽에 약한 정권 남당이 남아있지만 통일대업은 거의 다 이루어진 셈이었다.
남당왕 이욱(李煜)은 본래 왕위에 오르고 싶어 하지 않았다.
다재다능한 그는 왕이라기보다는 문학, 서예, 미술, 음률에 뛰어난 천재적 예술가로서 그 재능은 아버지 이경(李璟)보다 뛰어났다.
그러나 961년(태조2)에 이경이 죽은 후 마음의 준비도 없었던 그는 25세에 떠밀려서 정치무대에 오르게 되고 운명적으로 남당의 마지막 왕이 되었다.
이욱이 등극할 때 건국한지 2년이 된 송나라는 생기발랄한 기상을 띄고 있었다. 남당은 땅도 넓고 물자도 풍성한 나라였음에도 후주 세종에게 회남전투에서 패배한 후 중원 왕조의 일개 번진(藩鎭)으로 추락했고, 송나라가 수립된 후에도 여전히 번진의 자리를 지켰다.
이욱이 왕이 된 후 나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계속 송조(宋朝)에 신하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공물을 헌납했다.
순진한 이욱은 그렇게만 하면 나라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리하여 이욱은 중원의 송조를 공손히 섬겼고 아첨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즉위 초에 중서시랑(中書侍郞) 풍연로(馮延魯)를 송태조에게 보내 즉위표(卽位表)를 올리고 맏형과 둘째 형이 죽는 바람에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떠밀려 왕위에 오르게 된 사연을 고했다.
이와 동시에 송조에 대한 예의로 금기 2천 냥, 은기 2만 냥, 비단 3만 필을 헌납했다.
그리고 대국에 대해 절대 딴 마음을 품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호칭도 ‘왕(王)’이 아니라 ‘군주(君主)’로 하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그런데 이욱의 성격은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면이 있었다.
그는 문학을 사랑하고 음률을 즐기며 사치와 유람을 좋아하고, 자신의 뜻을 굽혀 남에게 아부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는 남에게 비굴하게 아첨할 것이 아니라, 허리를 똑바로 펴고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하고 싶었다.
그는 격앙된 어조로 조정대신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만일 송군이 침범해 온다면 나는 필연코 갑옷을 입고 전장에 나가 배수진을 치고 싸워서 이 사직을 지킬 것이오. 그렇지 않다면 보물과 나를 분신해서라도 남의 나라 귀신은 되지 않을 것이오.」
손자(孫子)가 말했다. “군사전략적으로 적이 싸우려 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할 경우, 만일 적이 강경한 언사를 사용하고 곧 싸울 태세를 취한다면 그 것은 적이 허장성세를 부리는 것이며 사실은 수비하려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조광윤은 이욱이 기세당당하게 큰 소리 치는 것을 보고 웃으면서 신하들에게 말했다.
「이욱이 입은 살아있지만 그런 포부는 절대 없을 것이오.」
과연 이욱은 큰소리 친 것처럼 그렇게 강경하고 큰 포부를 지니지 못했다. 중원의 송조라는 강적을 앞에 둔 이욱은 스스로 강대해지려 하지 않고, 자신의 안일한 생활만을 추구하면서 그럭저럭 살아갔다.
송나라가 건립된 지 3년을 맞던 해 남당은 송조에 세 번이나 조공을 바치는 바람에 국고가 텅 비게 되었다.
이리하여 재물을 상납하도록 백성들을 독촉하고 지나는 거위가 쌍 노른자를 낳거나 버들 솜이 생겨도 세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송나라가 형남, 호남을 평정하자, 이욱은 혼비백산하여 감히 전쟁준비를 못하고 사신을 송군에 보내 예물을 바치고 병사들을 위로하도록 했다.
또 급히 송조에 상소를 올려 호언장담했던 무례를 범한데 대한 용서를 빌었다.
후에 송나라에서 새 궁전을 짓는다는 말을 듣고 이욱은 즉시 은자 1만 냥을 헌납했다. 965년(태조6)에 송나라가 또 후촉을 멸하자 남당은 더욱 불안에 떨었다.
이듬해 이욱은 송조의 명령을 받들어 나라의 체면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대신을 남한에 사신으로 보내 함께 송조를 섬기자는 약속을 받아내려 했다. 이에 남한왕 유창이 거절하고 남당사신을 구금했다.
요컨대 이욱이 이와 같이 송나라를 두려워하고 부지런히 조공을 바친다 해도 그것은 “한낱 솥에 물을 뿌려 끓는 물을 잠재우는 것일 뿐” 결국은 송나라에 의해 멸망될 운명이었다.
이렇게 겨우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왕국에 대해 통일대업을 이룰 큰 뜻을 품고 있는 조광윤이 그냥 살려둘 리 없었다. 그러나 나약한 남당정권에 대해 그는 완전히 다른 방법을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