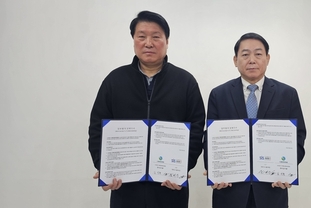▶ 형남(荊南) 멸한 후 이어 호남(湖南)을 평정
조광윤은 등극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호남왕 주행봉에게 중서령(中書令)을 겸직하도록 했다. 962년(태조3) 9월에 주행봉이 중병에 걸렸다.
임종 시에 형세를 분석하고 난 그는 신하들에게 당부했다.
「내가 죽은 후 내 아들 주보권에게 내 작위를 승계시켜 주시오. 나는 시골에서 군대에 들어온 사람이오. 함께 입대한 사람이 열 명인데 다 죽고 형주자사 장문표만 살아 있소. 그는 행군사마(行軍司馬)를 맡고 싶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해 늘 불만스러워했네. 내가 죽으면 장문표는 필연코 반역을 꾀할 것이니 당장 양사번(楊師璠)을 보내 토벌하도록 하시오. 만일 성공하지 못하면 싸우지 말고 성을 지키고 있다가 송조정(宋朝廷)에 귀순하기 바라오.」
양사번과 주행봉은 고향의 인척간이다. 친군(親軍)도지휘사로 있는 양사번은 여러 번 전공을 세워 주행봉의 깊은 신임을 얻고 있었다. 주행봉이 병으로 죽자 그의 아들 주보권이 작위를 이어받았다. 과연 주행봉이 예측한 바와 같이 주보권이 무안(武安)절도사를 승계했다는 소식을 들은 장문표는 노발대발했다.
「나와 주행봉은 미천한 데서부터 기병(起兵)하여 공을 세우고 구사일생으로 싸워왔는데, 어찌 나더러 쬐끄만 놈을 섬기라는 건가?」
이때 마침 군사를 이끌고 영주(永州)로 이동 중이던 주보권이 형양(衡陽)을 지나게 되자 장문표는 급히 군대를 끌고 반기를 들었다.
그들은 흰 상복을 입고 무릉(武陵)으로 문상하러 가는 부대로 위장했다가 말머리를 돌려 곧장 상덕(常德)으로 달려갔다. 담주(潭州)를 지나갈 때 장문표는 그곳을 지키고 있던 행군사마(行軍司馬) 요간(廖簡)을 죽이고, 담주의 관인(官印)을 빼앗아 행군사마 역할을 했다. 장문표가 반역했다는 소식이 상덕에 전해졌다.
주보권은 양사번에게 군사를 이끌고 장문표를 토벌할 것을 명했다. 출정하기 전 주보권은 그의 아버지 주행봉이 부탁했던 말을 양사번에게 전해주었다.
이에 양사번은 감격해 했고 절대 선왕(先王)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주보권은 또 송나라에 사자를 파견해 호남에 지원군을 파병해 줄 것을 애원했다.
그리하여 조광윤은 장문표의 반역을 진압한다는 것을 구실로 삼아 호남을 구하러 대군을 파견했는데, 그 목적은 호남과 형남을 수복해 번진을 없애는데 있었다. 양사번은 처음에 불리한 상황에 부딪쳐 연달아 몇 차례 실패의 쓴 맛을 보았다.
그러나 주행봉의 은혜에 보답하고 결사적으로 주보권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인 결과, 그는 얼마 안 되어 전국(戰局)을 뒤바꾸어 놓고 평진정(平津亭)에서 장문표를 대파했다. 그리고 담주를 점령하고 장문표를 사로잡아 처형했다. 양사번이 장문표를 평정하고 있을 때 송군도 이미 형남정권을 평정했다.
이때 호남의 군사반란이 평정되었기 때문에 송군의 지원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그러나 만일 여기에서 멈추고 송군이 되돌아간다면 호남을 없애는 기회는 잃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송군은 말머리를 돌리지 않고 밤낮으로 병력을 보강해 호남의 낭주(朗州)로 진군했다.
주보권은 송군이 호남을 향해 돌진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급히 관찰판관(觀察判官) 이관상(李觀象)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
아무런 방법이 없고 속수무책인 것은 이관상도 마찬가지였다. 이관상은 크게 비관했다.
「이미 장문표가 처형되었는데도 황군(皇軍)이 돌아가지 않는 것은 호남을 노리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은 북쪽의 형저(荊渚) 뿐인데 형남의 고계충은 이미 송조(宋朝)에 귀속되었고 낭주도 보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예 송조정(宋朝廷)으로 돌아가 부귀영화를 계속 누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관상이 내놓은 ‘뜻을 굽혀 안전을 꾀하는 방안’에 대해 지휘사(指揮使) 장종부(張從富) 등은 단호히 반대했다.
자기주장을 펴지 못하는 주보권은 송군과 싸우고 싶지 않았지만 군사를 통솔하고 있는 장수들을 억누를 방법도 없었다. 그들의 의견을 따라 송나라에 저항하는 수밖에 없었다.
모용연소와 이처운은 먼저 정덕유(鄭德裕)를 낭주에 보내 주보권을 위로하도록 했다.
그런데 정덕유는 장종부 등 호남장수들의 문전박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장종부는 교량과 선박을 파괴하고 나무를 베어 도로를 막았다. 이러한 삼엄한 상황을 본 정덕유는 경솔하게 교전을 벌이지 못하고 후퇴해 명령을 기다렸다.
모용연소가 이 상황을 조정에 보고했다. 주보권이 송군에 저항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송태조 조광윤은 강경한 어투로 쓴 질책의 조서를 급히 보냈다.
「짐(朕)은 그대들의 지원요청을 받고 대군을 급파해 어려움을 타개하도록 했다. 그런데 오늘 흉악한 무리가 모든 것을 파손해 그대에게 큰 화를 가져다주었느니라. 어찌하여 황군(皇軍)에 저항하는가? 이것은 스스로 도탄에 빠지는 것이고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니라!」
날카로운 언사를 사용해 위엄을 보여준 질책은 죄를 덮어씌우려는 것이었다. 조광윤은 호남지역을 반드시 탈취해야 했기 때문에 강도 높은 질책으로 주보권을 제압하려했던 것이다.
송군이 칼날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퇴로가 없어진 주보권은 장수들의 의사에 따라 군사를 이끌고 저항했다. 모용연소는 병력을 몇 갈래로 나누어 전도도감(戰棹都監) 무회절(武懷節)에게 악주(岳州)를 탈취하도록 명했다.
그들은 삼강구(三江口)에서 주보권의 군사를 대파하고 700여척의 함대를 노획하고 악주를 점령했다. 장종부는 군사를 이끌고 풍주성(灃州城)의 남쪽에서 송군과 저항해 싸웠다.
그런데 접전이 개시되기도 전에 호남군사들은 뿔뿔이 도주했고, 이처운은 그 뒤를 바싹 추격했다.
송군을 저지하기 위해 주보권은 최후의 발악으로 낭주성에 불을 지르고 백성을 성 밖으로 내몰았다.
낭주에 진입한 모용연소는 서산(西山) 밑에서 장종부를 사로잡아 참수한 다음 대중에게 보여 주었다.
호남왕 주보권은 이처운의 부하 전수기(田守奇)에게 붙잡혀 항복했다.
이로써 호남의 14개 주, 1개 감(監), 66개 현, 9만 7,000여 세대가 송나라에 귀속됐다. 조광윤은 병법의 계책을 이용해 호남을 수복함으로써 길을 빌려 형남을 정벌한 승리의 전례를 또 하나 만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