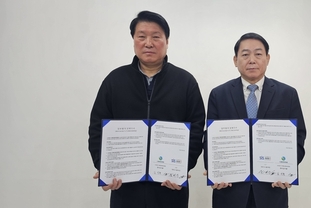문인정치는 송태조 조광윤이 심혈을 기울여 실행하고자 한 정치구도이며 이로부터 형성된 실행패턴이 관리임명의 문관제도였다.
지식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송태조의 정치철학이고 문인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외재적인 형태일 따름이다.
그렇다면 조광윤이 실시한 문인정치의 내재적인 실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을 다스림에 있어서의 지식론과 도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조광윤은 전통적 도덕관을 숭상하고 문관이 통제하는 사회를 건설하려고 노력했고, 성현이 가르친 문화수준이 높고 단순하고 청렴한 이상적 사회를 추구하며 끊임없이 분투했다.
조광윤은 소년시절 때부터 『시경(詩經)』, 『상서(尙書)』, 『예악(禮樂)』 등 제자백가(諸子百家)의 경전을 공부했다.
진교병변에 의해 하루아침에 황제가 되어 천하에 군림하게 된 그는 고대시기에 인의로 백성을 사랑하고 덕으로 정치를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문인을 육성하고 등용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당나라 말기와 오대(五代)시기의 무인들이 날뛰던 폐단을 없애고 세상을 바꾸어 혼란한 상태를 바로 잡으려고 했다.
송태조 조광윤은 오대시기의 정치, 경제, 문화를 직접 체험한 사람이다. 황제가 된 후 그러한 기형적 문무관계며 군인이 위세를 부리는 정치국면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에 대해 그는 늘 고심했다.
중앙에서는 병권을 장악한 추밀사가 마음대로 나라와 군사대권을 휘두르면서 엄연히 제2의 권력중심을 형성했다.
지방에서는 무인출신의 절도사들이 사실상 제후(諸侯)의 역할을 했으며, 절도사와 그 측근들로 구성된 권력구도에 의해 모든 행정, 사법, 재무, 과세의 권한을 행사하면서 사회는 준(準)군사화된 행정관리 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것은 정치적 암흑과 행정관리의 무질서를 초래하고 경제는 퇴보했다. 이러한 군사화의 행정관리 하에 천하는 사분오열되어 툭하면 전쟁을 일으켰고 백성은 힘들고 무거운 과세와 노역, 그리고 매서운 형벌의 위협 하에 허덕였으며 조정의 명령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계속 군인이 권력을 전횡하는 ‘무인정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도덕과 인의를 통치이념으로 하는 ‘문인정치’를 시행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조광윤은 황제가 된 첫날부터 이미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다.
송태조 조광윤은 주문왕(周文王)의 사적을 읽고 감개하여 말했다.
「주문왕은 무기를 거두고 훌륭한 성품으로 백성을 보호했다. 백성들이 올바른 성품을 갖도록 가르치고 재물을 구하여 옳게 쓰게 하며,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을 명백히 구분하고, 문화로 다스려 나쁜 것은 버리고 이로운 것만 추구하며, 인덕을 베풀고 위엄을 떨쳤다. 짐(朕)도 주문왕을 본받을 것이다.」
백성을 보호하고 가르치고 잘 살게 하여 주문왕의 정치를 펼치려는 그의 이념은 아주 강렬했다. 또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법칙을 논한 맹자(孟子)의 말을 읽고 크게 감명을 받은 조광윤은 이렇게 말했다.
「짐(朕)은 맹자의 가르침을 받들어 정치를 펼칠 것이오!」
조광윤은 백성에게 인자한 정치를 펼치고 조세와 형벌을 감면하며, 번진들의 횡포를 제거해 단호히 문인정치를 펼치기로 마음먹었다.